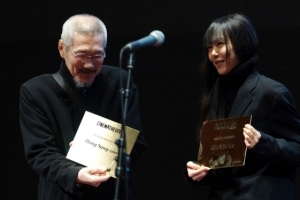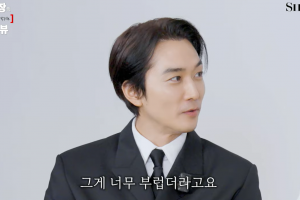2001년 캐나다와 프랑스 문학계를 강타한 신인 작가가 있다. 넬리 아르캉이다. 넬리는 ‘창녀’라는 제목의 장편소설로 데뷔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가장 큰 이유는 ‘창녀’가 작가의 자전소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몬트리올에서 5년 동안 매춘부로 일했다. ‘창녀’는 그때의 체험과 허구가 절묘하게 뒤섞여 탄생한 작품이다. 한국에는 2005년 번역됐는데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한다. 이 소설이 저급한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권력의 장과 얽힌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착과 파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괜찮은 문학임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내가 매춘하기 쉬웠던 것은 원래부터 내가 타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평소에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내게 이름을 붙여 주고, 외출과 귀가 시간을 일일이 정해 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꼬박꼬박 챙겨 줄 선생님을 대주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존재 말이야.”(성귀수 옮김)
이런 구절과 대면할 때, 독자는 지금 본인의 존재 양태를 의심하게 된다. 특정한 정체성을 강제하는 공동체에 속한 자신이야말로 실은 매춘부-타인들의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처럼 뛰어난 작품성을 갖춘 등단작으로 넬리는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미친 여자’ 등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던 2009년 9월, 돌연 넬리는 세상과 절연했다. 그녀의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영화 ‘넬리’는 숭고와 퇴폐의 간극을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자기 과시와 자기 결핍을 어지럽게 오가다, 결국 스스로의 운명에 직접 마침표를 찍은 그녀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안 에몽 감독은 특히 넬리(밀렌 매케이)의 자아가 분열하는 양상에 집중한다. 범박하게 말하면, 이것은 매춘부와 작가 사이의 괴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매춘부와 작가 사이의 착종이 가로놓여 있다. 몸 파는 일과 글 쓰는 일이 별개의 작업일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혹은 상실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연관성을 가진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안 에몽 감독은 영화에 많은 거울을 배치해 놓았다. 넬리를 비추는 거울들은 그녀의 나르시시즘만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이자벨(어린 시절 이름), 신시아(매춘부 시절 이름), 넬리(작가 시절 이름)로 살았던 한 여자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할 때, 그것은 거울에 비친 왜곡된 이미지로밖에 재구성해 낼 수 없다는 재현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장치다. 또한 이것은 거울에 비친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뜨끔한 전언이기도 하다. 그래서 넬리는 방황했다. 그녀가 진짜 ‘나’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뜻이다. 24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