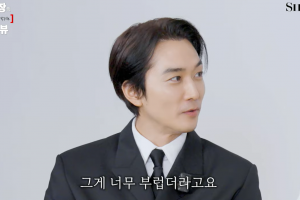눈으로 영화 보고… 귀로 무대위 오페라 가수 노래 듣고…
필름오페라 ‘미녀와 야수’로 13년 만에 내한 작곡가 필립 글래스“어린 시절 아버지의 레코드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존 콜트레인, 엘비스 프레슬리 등 온갖 음악을 다 들었죠. 그때 처음 음악에 이끌렸어요. 돈은 못 받았지만요.”(웃음)

연합뉴스

내년이면 팔순이지만 필립 글래스는 여전히 다양한 장르와의 실험을 즐긴다. 그는 “내가 도전하는 음악의 의미는 늘 같지만 표현 방식은 늘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온 인디언 아티스트들과 작업했는데 이렇게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과의 협업은 좋은 자극제가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 볼티모어의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던 소년은 현대음악의 거장이 됐다. 미니멀리즘이라는 혁신으로 음악계에 파고를 일으킨 미국 작곡가 필립 글래스(79)다. 그가 22~23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를 선보이려 13년 만에 내한했다. 22일 오전 공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마주한 노장은 “작품을 보면 6분 만에 관객들이 ‘아!’ 하며 한순간에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밤 한국 관객들도 그럴 것”이라며 천진하게 웃었다.
글래스는 교향곡, 오페라, 실내악, 발레음악뿐 아니라 영화음악까지,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전방위 예술가로 유명하다. 특히 영상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음악은 이미지에 대한 내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작곡을 시작하면서 영화 작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왜 연기가 음악과 별개로 다뤄지는지였죠.”
●박찬욱 감독 ‘스토커’ 영화음악 작곡
그가 영화음악을 맡은 ‘트루먼쇼’는 1996년 골든글로브 최우수작곡상을 수상했고 ‘디아워스’, ‘쿤둔’, ‘일루셔니스트’는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양쪽에서 모두 후보에 올랐다.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영화음악도 작곡했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요? 전화를 받으면 하죠(웃음). 작곡가의 인생에서 오페라나 교향곡보다는 다수의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상업영화는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에요. 유동적이지만 즐거운 도전이죠. 마틴 스콜세지, 우디 앨런, 박찬욱처럼 재능 있고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박찬욱 감독은 아주 흥미로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내일도 만날 거예요.”
1994년 만들어져 이번에 국내 초연하는 ‘미녀와 야수’ 역시 영화와 오페라의 랑데부를 시도한 독특한 작품이다. 프랑스 영화감독 장 콕토의 1946년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소리를 모두 걷어내고 음악을 새로 입혔다. 이 작업을 위해 글래스는 영화를 2분~2분 30초가량의 장면 30개로 나누어 배우들의 입 모양과 노래에 흐르는 각각의 단어, 음을 딱 맞아떨어지게 맞췄다.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묵음 처리된 영화를 보는 동시에 배우들의 입에 맞춰 노래하는 무대 위 성악가들을 보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
●1946년작 ‘미녀와 야수’에 음악 입혀
“처음에는 생경하지만 85분간의 공연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관객들이 따로 돌아가던 영상과 노래를 하나로 일치해 이해하면서 감상하게 됩니다. 오페라 가수들도 영상 속 배우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공연하게 되죠. 배우들의 입 모양과 음악을 맞추는 작업은 빨래를 하나씩 펼쳐 너는 것과 같아요.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쉬운 작업인데 내가 한 이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데 놀랐죠. 벌써 관객들이 ‘아! 바로 저거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웃음)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03-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