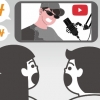구조 작업조차 욕 먹는 정부
열흘 동안 생환자 0명.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최상의 구조 여건’이라던 소조기(22~24일·조류의 흐름이 한 달 중 가장 느린 시기)가 끝난 25일까지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자 가족들의 간절함은 절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해운 당국 간 민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사고 발생 이후 초동 대응 등 숱한 오점을 남긴 정부가 구조 작업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정부는 “총력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는다. 여론을 의식해 수색 현황을 과장해 발표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이배에 담은 간절함
세월호 침몰 10일째인 25일 한 실종자 가족이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실종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배를 바다에 띄운 채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색 인원을 ‘뻥튀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부 등 대원 500~700명을 구조 현장에 투입한다고 매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대기 인력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바다에 들어가 작업하는 요원은 하루 80여명(25일 기준) 정도다. 한 민간 잠수부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투입 인원이 더 많아 보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잠수부 투입 제한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져 간다. “정부가 자비를 털어 구조 현장에 온 민간 잠수부들의 입수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한 축인 민간 참여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뿐이다. 대책본부는 “현재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난구조대(SSU) 등이 제한된 시간 동안 구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민간 잠수요원의 참여를 제한했다”면서 “실종자 가족들도 민간 잠수부 투입이 효율성을 떨어뜨릴까 봐 걱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24일 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민간 잠수부 등을 모두 동원해 구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정부와 군은 민간 잠수요원들이 함께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조직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우려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형 장비의 투입 지연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정부는 이 대표가 보유한 잠수장비인 ‘다이빙벨’의 투입을 막다가 실종자 가족의 항의에 밀려 이날 뒤늦게 허가했다. 또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돕는 바지선도 ‘2003 금호 바지선’에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사의 ‘리베로 바지선’으로 지난 23일 교체해 “다른 민간 구조대원들의 접근은 막은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다이빙벨은 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언딘사의 바지선은 잠수 작업 전용으로 잠수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감압 체임버와 첨단 잠수장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번 믿음을 잃은 실종자 가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도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