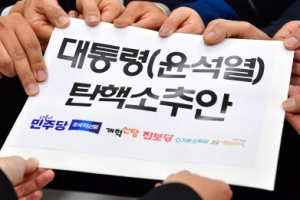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그러던 중에 행렬은 막 한 굽이 솔숲길을 돌아, 메마른 갈대와 억새가 흔천으로 깔린 여울가 늪지대가 저 아래로 바라보이는 개활지로 나섰다. 그곳에 이르자 신부가 두리번거리는 꼴이 아마도 소피를 볼 수 있는 후미진 장소를 찾는 것 같았다. 바라보는 총중이 조마조마하던 중에 이윽고 맞춤한 장소를 찾아내어 뒤집어썼던 쓰개치마를 벗어 길섶에 내려놓고, 솔숲 속으로 얄기죽얄기죽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솔밭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소나무 등걸 아래로 들어간 각시가 여러 총중이 빤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내외를 두는 법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치마를 썩 걷어올렸다. 그러고는 오목주발 같은 젖통을 수습하는 일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고쟁이까지 벗어 장딴지 아래로 내렸다. 뿐만 아니었다. 응당 길에 있는 일행들과는 마주보고 숨어 앉아야 할 것인데도 어찌된 셈인지 엉덩이를 일행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과단성 있게 돌리고 앉아 소피는 보는 것이었다. 박속같이 희디흰 엉덩이가 훤하게 바라보이도록 비위짱 좋게 고쟁이를 까내리자, 지척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침 삼키는 소리가 낭자하였다. 산골에서 살고 있는 본데없는 계집사람이라 해서 반죽이 없으란 법은 없겠으나, 해죽해죽 웃음을 흘리는 계집의 교태가 닳고 닳은 기방의 수청 기생의 미술을 뺨칠 만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신행길 간다는 사람들이 곁꾼이나 길봇짐 하나 없이 단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호젓한 길목에서 마주친 미색에 빠져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다.

꿇어앉힌 원상들에게서 물미장을 빼앗고 있는 산적들의 수효만 얼른 헤아려도 여섯이었다. 허우대는 한결같이 물고를 뽑은 듯 훤칠하고 손에는 칼 아니면 화승총까지 들고 있었다. 굳이 미색을 동원하여 양동을 쓰지 않아도 조기출 일행쯤은 단박에 난장 박살시킬 수 있는 결기와 병기를 갖춘 셈이었다. 개중에 면상이 곱상하게 생긴 놈이 방금 솔숲에서 기어나온 차인꾼을 손짓으로 불러 세웠다. 자신의 강단만 믿고 대중없이 덧들이던 일행 한 사람이 벌써 궐자 앞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움직임이 전혀 없고 신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절명한 것이 틀림없었다.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색흔(索痕)으로 보아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명줄을 끊었으니, 이들의 잔인함에 등골이 싸늘하게 식어왔다. 몸은 저절로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란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사태가 그러했으므로 손짓을 따라 다가가는 차인꾼의 안색은 새파랗게 질려 그대로 사색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옹구바지 사이로 싼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계집을 뒤따라 농탕을 쳤던 일행이 미인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엔들 깨달았을까.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벌어진 작변을 일행은 손 한번 쓸 겨를도 없이 얼혼이 빠진 채로 우두망찰하였다. 적당들이 일행들에게 미인계를 쓴 것은 부상 일행들의 세력을 둘로 흩어지게 만들어 복물을 털기에 손쉽도록 양동을 쓴 것인데, 그 또한 눈치채지 못한 불찰이 컸다. 그러나 이제 와서 깨달았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2013-05-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