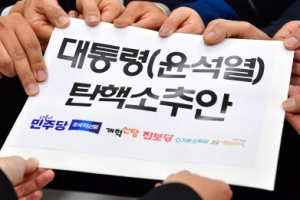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행수는 불문곡직 사내를 들쳐 업었다. 부러진 한쪽 다리가 하반신 아래로 축 늘어졌다. 아래쪽 자드락길에서 무명짐과 시겟짐을 수습하고 있던 동무들은 시신이나 다름없는 사내를 업고 가파른 기슭을 내려오는 행수의 거동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고샅길 어귀에 똥 본 개 새끼들처럼 우르르 모여들었다.

“당장은 붙어 있네만 서둘러 따뜻한 봉노에 안동하지 않으면 당장 저승사자가 업어가겠구먼. 추운 날씨에 기한인들 오죽했겠나. 우리가 조금만 늦게 당도했어도 그대로 강시 날 뻔했네.”
“이런 변고가 있나…. 적변을 당한 것입니까. 짐승을 만난 것입니까. 떠돌이 왈패들에게 걸려들어 매타작을 당한 것입니까? 어떤 육시랄 놈의 소행인가.”
“어떤 무뢰배나 산적의 소행인지, 짐승을 만난 것인지 알 수 없네만, 냉큼 조처하지 않으면 이런 혹한에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네.”
“실족을 했다면 자드락길이긴 하나 가근방 길목이 그다지 험하지 않고… 매타작을 당했다면, 봇짐 털려던 무뢰배나 산적이었겠지요.”
“그런 말 할 경황 없네.”
난감한 일이었다. 명색 신표(信標)를 지닌 원상으로 자처하는 행상이라면 노상에서 마주친 행려병자나 실족한 동배간을 구완하지 않고 지나친 사례는 없었다. 사람에 따라 구급에 인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나중에 들통나면, 임소나 접소에 끌려가서 혹독한 징치를 당하는 것이 예로부터 원상들이 지켜온 엄중한 기강이었다. 그러나 정한조 일행이 구완해야 할 이 길손은 본색조차 알 수 없었다. 그것이 그들을 잠시 망설이게 했다. 행수 정한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일행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초주검이 된 포병객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견마 잡았던 만기와 동행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뒤에 남은 일행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나귀와 등짐 들을 다시 수습하여 뒤따르도록 하였다. 샛재를 겨냥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종종걸음하는 행수의 뒤를 따르던 만기가 물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원상이라면, 신표를 지녔거나 추수전(秋收錢)에 바친 척문(尺文, 영수증)을 지니고 있을 텐데요?”
“사추리 밑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지 못했네….”
“갓 쓰고 박치기를 해도 제멋이라지만 이 작자가 원상도 아니라면, 무슨 배포로 이 험한 산길에 대중없이 뛰어들었을까요. 횡액을 당할 것을 진작에 예견했을 만한데요.”
“요사이는 접소에 적을 둔 원상이 아니라도 행세하는 잠상배나 부랑꾼 들이 많아서 신표를 지녔다 해도 도무지 본색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네. 조정에서는 지난 임오년 난리를 겪고부터 서북인이며 송도인이며 서얼이나 역관, 서리, 군졸 할 것 없이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장시에까지 양반의 직첩이 흘러나와 거래될 뿐만 아니라, 절집을 중수한답시고 공명첩까지 내돌리고 있지 않은가. 굶어 죽지 못해 명줄만 겨우 지탱해 오던 하찮은 궁반들도 보부상 노릇 한답시고 장시에서 물화를 사고팔도록 조처하여 어느덧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 수상한 시절이 되고 말았네. 빈부귀천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걸 빗대어 하는 말일세. 요사이 들어선 장시에 창궐하는 무뢰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약초 캐어 연명한다는 산척(山尺)이며 난데없는 협잡꾼들까지 지난 신분을 숨기고 장시 어귀에서 사사로이 다듬은 물미장을 내저으며 행세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허욕이 난무하고, 완악하고 거만한 작자들이 장시를 주름잡고 있어 은혜와 의리는 이제 우리와 거리가 멀게 되었다네. 그것은 자네도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대원위대감이 청나라로 붙들려간 뒤 나라의 제도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뀌고 있어. 우리 부상들도 덩달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네. 그건 그렇구 서두르게.”
“시세가 글렀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원상들이 지켜오던 정리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는 없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보다 더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야. 더욱이 우리 소금 상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선 안 되네.”
2013-04-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