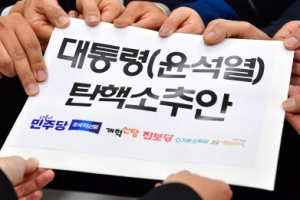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얼마 가지 않아서 만기가 두고 온 벼랑길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러나 잡도리해 두었다는 네 필의 당나귀는 만기가 버리고 온 장소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시겟짐을 등에 붙인 채로 한가롭게 서 있었다. 한 마리는 비게질을 한답시고 나뭇등걸에 엉덩이를 비비적거리고 있었다.

산적이 매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든, 나귀들이 놀라지 않게 시간을 끌며 지켜보든, 모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기와 마주칠 수 있었다. 지루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제야 행수가 잡목숲에서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일어서긴 했지만 한동안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산적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고, 나귀들이 놀라지 않았다면 저들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뛰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한 사태들을 예견할 수 있는 안목이 행수인 그에겐 있었다. 그는 드디어 천천히 다가가 나귀들의 고삐를 잡아채는 데 성공했다. 뒤따르던 수하 동무들 역시 다가와 길바닥에 곤두박인 지게를 수습하였다. 소란을 피우던 까치 소리도 가까스로 멎었다.
그렇다면 만기와 마주쳤다는 길손은 도대체 본색이 무엇인가. 달아난 노비를 추쇄하던 작자인가. 아니면 육로행상으로 자처하고 나선 적탈민인가. 아니면 관아의 재물에 포흠을 저지르고 도망하던 구실아치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낮도깨비를 보았다는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푼전의 삯전을 받고 발품을 팔던 보행꾼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으나 도무지 이렇다 할 짐작이 없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행수는 만기가 보았다는 사람의 형용이 이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고삐를 수하 동무에게 건네고 난 뒤 벼랑길 위쪽에 있는 바위 아래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직 녹지 않은 눈 위로 낙엽과 눈이 서로 엉켜 어수선하게 흩어진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차가운 눈 위에 코를 박고 쓰러진 채로 혼절한 한 사내를 발견하였다. 위인은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볼기짝을 드러낸 채 코를 박고 널부러져 있었다. 굴뚝에서 빼놓은 족제비 꼴인 사내를 발견하는 순간, 동무들을 부를까 하다가 그만두고 앞으로 엎어진 사람을 바로 눕힌 다음 진맥부터 해보았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손바닥에 가느다란 맥박이 가물가물 집혀왔다. 그때까지 명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천행이었으나, 강시나 다름없는 사람의 행색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염하다가 내다버린 사람처럼 형용이 흉칙하였다. 입성이란 것을 걸치고 있긴 하였으나, 콧등이 베어나갈 듯한 혹한에 배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시뻘건 동저고리 바람인데 그 또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누더기가 겨우 거웃을 가리고 있을 뿐 사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긁히고, 찍히고, 파이고, 멍들어서 전신에 앵혈 같은 자국투성이인 것으로 보아 그가 이 산속에서 겪은 경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괴나리봇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호랑이나 개호주를 만나 욕을 당한 것인지도 몰랐다.
2013-04-0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