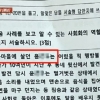조갑상 소설집 ‘테하차피의 달’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

소설가 조갑상
“제의 형식이건, 조문 형식이건 죽음과 그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뿐 아니라 과거의 만남, 인연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 끄집어내는 것이 작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만난 소설가 조갑상(60)은 최근 펴낸 소설집 ‘테하차피의 달’(산지니 펴냄)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 먼저 가버린 사람들을 반추한다. 작가가 순탄하게 맺었던 평탄한 관계를 그리워할 리 없다. 조갑상은 애써 묻어두고 싶던 고통과 갈등의 기억을 떠올리며 의미를 되살리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다.
조갑상은 “과거의 죽음, 과거의 인물 등 현재의 나에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소설의 주제로 삼았다.”면서 “아름다운 기억이야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이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역시 되살려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설집을 죽음에 대한 제문 형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에 실린 8편 모두 한 가지로 주제를 꿰뚫는다. ‘아내를 두고’, ‘통문당’, ‘겨울 오어사(五魚寺)’ 등은 아내 또는 과거의 연인 등을 회상하며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도를 풀어낸다. 심지어 ‘누군들 잊히지 못하는 곳이 없으랴’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집안에서 하녀 ‘조선인 오모니’로 일하다가 살해당한 혼령을 불러내 잔잔한 해원(解?)의 마당을 펼친다.
그는 흔치 않은 과작(寡作)의 작가다. 중앙대 문창과 졸업 이후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내놓은 소설집이 ‘다시 시작하는 끝’(1990년), ‘길에서 형님을 잃다’(1998년)에 이어 이제 겨우 세 번째다. 중간에 장편소설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2003년)를 내놓긴 했지만 지독히도 과묵한 작가다.
교수(경성대 국문과)로 강단에 서면서도 절필이나 게으름은 없었다. 그저 부산에 눌러앉아 우직한 걸음을 떼왔을 뿐이다. 그는 “1년에 단편 두 작품 정도씩을 꾸준히 써왔으며 지금 쓰고 있는 장편도 연말쯤이면 출간될 것”이라며 ‘과작’이라는 평가에 손사래를 쳤다. 어쨌든 일상에서나 예술에서나 감동과의 거리를 따졌을 때 다변(多辯)보다 눌변(訥辯)이 좀더 가까웠던 경험, 다들 있지 않은가.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9-10-1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