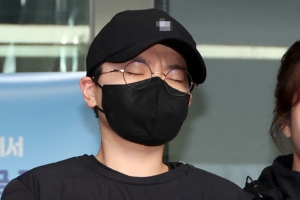피부가 약간 검은 쌍둥이는 DNA 검사 결과, 인디언 9%와 북부 아프리카인 11%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시험에서 ‘소수인종 쿼터’ 등 혜택을 보기엔 늦었지만 몰더와는 여기서 착안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서 인종 감별 업체를 차렸다.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한번에 99∼250달러(약 9만∼25만원)를 주면 인종 및 민족을 감별해주는 DNA 검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와 친자 감별이 목적이었지만 앞으론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등을 알아내는 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학과 공직자 시험 외에도 인종 감별이 유용한 곳이 많다. 자메이카 출신 노예와 스코틀랜드 출신 노예 소유주 사이에서 태어난 펄 덩컨은 유산을 찾으려고 DNA 검사를 받았다. 스코틀랜드인 피가 10% 섞인 그는 4대조 할아버지가 남긴 20개의 성(城) 중 하나라도 달라고 후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기독교도란 이유로 거절된 존 해드리히는 DNA 검사를 통해 유대인임을 입증했다. 유대인에게 흔히 발견되는 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유대 혈통을 감췄을 것이란 주장이다.
인디언들도 혈통 찾기에 부심한다. 인디언으로 밝혀지면 장학금과 보건서비스, 카지노 개업 등 혜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국은 1988년부터 인디언 부족들에 카지노 영업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DNA 검사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상의 흔적이 미미해서 제대로 판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탓이다.
또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뿌리째 흔들릴 소지도 있다. 킴 톨베어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공공의 선의가 악용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DNA 검사를 통해 언니가 2% 동아시아인으로 밝혀진 한 여학생은 입학 원서에 아시아인으로 표시했다.98%는 유럽인이지만 결국 아시아인 장학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DNA 검사 결과를 법의학 증거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호기심 차원에서 해 보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