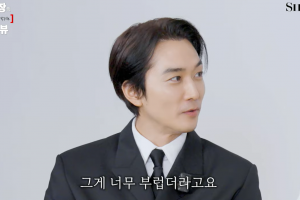차를 몰다 라디오를 트니 ‘funky town’이라는 오래된 팝송이 나온다. 막 대학에 입학한 1980년 초 기숙사에서 해방감을 맛보려 카세트의 볼륨을 높여놓고 자주 들어 귀에 익은 노래다. 우리 가수로는 조용필이 막 날리기 시작할 때라 ‘행복한 사람’‘제비꽃’이라는 노래의 잔잔한 음률도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야 입시에 쫓겨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유별난 친구들이 있었다. 꼬박꼬박 엽서에 신청곡을 적어 방송국에 보내 놓고 나오는지 기다리는 녀석, 팝송의 가사를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어 달달 외우는 친구도 있었다. 노래를 부를 곳은 더 없어 도서관에서 밤늦게 나와 여럿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소리를 내질렀다.
어느날 방과후 친구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다놓고 교실에서 ‘노래자랑’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10여명이 돌아가며 두시간이 넘도록 대여섯곡씩 불러댔다. 교실 노래방이었던 셈이다. 나도 귀동냥으로 익힌 노래들을 여러 곡 불렀다. 그중에서 박수를 많이 받은 노래가 ‘눈동자’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 노래방에 가면 “눈동자 좀 들어보자.”고 조르는 녀석들이 있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고등학교에 다닐 때야 입시에 쫓겨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유별난 친구들이 있었다. 꼬박꼬박 엽서에 신청곡을 적어 방송국에 보내 놓고 나오는지 기다리는 녀석, 팝송의 가사를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어 달달 외우는 친구도 있었다. 노래를 부를 곳은 더 없어 도서관에서 밤늦게 나와 여럿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소리를 내질렀다.
어느날 방과후 친구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다놓고 교실에서 ‘노래자랑’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10여명이 돌아가며 두시간이 넘도록 대여섯곡씩 불러댔다. 교실 노래방이었던 셈이다. 나도 귀동냥으로 익힌 노래들을 여러 곡 불렀다. 그중에서 박수를 많이 받은 노래가 ‘눈동자’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 노래방에 가면 “눈동자 좀 들어보자.”고 조르는 녀석들이 있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4-1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