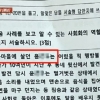◎장삿속 외화 우대… 방화상영 외면·계약파기도/제작·배급 분리안된 유통구조개선 시급
영화판에서는 영화를 극장에 내건다는 뜻으로 「붙인다」는 말을 쓴다.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말은 선전 포스터나 간판을 붙인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최근 영화판에서 이 말의 사용빈도수가 부쩍 늘고 있다.「주요 개봉관에 영화를 붙이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영화를 제작한뒤 관객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영화가 대부분 방화라는데 있다.
이처럼 영화를 붙이기가 어려운 것은 영화제작과 배급이 분리돼있지 않은데다 영화시장의 배급·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인데서 비롯된다.제작과 배급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작자 또는 감독이 직접 자기가 만든 영화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영화 만들기에 전념해도 좋은 영화를 만들까 말까한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장사」에 더 정신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하에서 바로 그 「장사」는 제작보다 더 어렵다.「장사」가 쉬운 일이었다면 영화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급망은 서울을 비롯,크게 6개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또 각 권역에는 100개 이상의 극장이 있다.때문에 제작자와 감독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권역의 영향력있는 배급업자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배급망이 인맥과 금맥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그래서 처음 영화계에 들어온 제작자들은 영화를 팔기가 더욱 어렵다.이때문에 젊은 영화제작자들의 유입이 차단되고 있기도 하다.
영화를 붙이기가 어렵다보니 일부 제작자들은 극장측에 거액의 「뒷돈」을 주면서 영화를 붙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또 배급라인이나 극장측의 횡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신씨네가 「101번째 프로포즈」를 종영할수 밖에 없었던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신씨네는 당초 중앙극장측과 관객이 하루 2천명이하로 떨어지지 않는한 종영하지 않는다고 계약했었다.그러나 중앙극장측은 관객이 2천명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음에 붙일 외화「쥬라기공원」이 흥행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자 서둘러 「101번째…」의 종영을 결정,영화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영화판에 이름이 알려져 극장측의 횡포에 대항할수 있었던 신씨네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에 속한다.아직 이름석자를 내밀만한 형편이 못되는 제작자나 감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배급업자나 극장측에 대항했다가는 다음번에 제작한 영화를 붙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방의 영세한 배급자나 극장에서 입장 관객수를 줄이는 것도 유통구조상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관객수를 속여 줄이는 것은 곧바로 제작자에게 분배 수익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영화제작자나 감독들은 영화유통구조의 개선을 우리 영화계 최대과제로 손꼽는다.유통문제와 함께 3대과제로 꼽혀온 기획능력부족과 소자본 제작문제는 젊은 기획자와 대기업의 참여로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유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당국등이 나서 자본력을 갖춘 배급망을 조속히 구성,영화제작자들이 유통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산영화가 활로를 찾을수 있다는 것이 영화관계자 대다수의 지적이다.<황진선기자>
영화판에서는 영화를 극장에 내건다는 뜻으로 「붙인다」는 말을 쓴다.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말은 선전 포스터나 간판을 붙인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최근 영화판에서 이 말의 사용빈도수가 부쩍 늘고 있다.「주요 개봉관에 영화를 붙이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영화를 제작한뒤 관객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영화가 대부분 방화라는데 있다.
이처럼 영화를 붙이기가 어려운 것은 영화제작과 배급이 분리돼있지 않은데다 영화시장의 배급·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인데서 비롯된다.제작과 배급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작자 또는 감독이 직접 자기가 만든 영화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영화 만들기에 전념해도 좋은 영화를 만들까 말까한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장사」에 더 정신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하에서 바로 그 「장사」는 제작보다 더 어렵다.「장사」가 쉬운 일이었다면 영화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급망은 서울을 비롯,크게 6개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또 각 권역에는 100개 이상의 극장이 있다.때문에 제작자와 감독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권역의 영향력있는 배급업자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배급망이 인맥과 금맥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그래서 처음 영화계에 들어온 제작자들은 영화를 팔기가 더욱 어렵다.이때문에 젊은 영화제작자들의 유입이 차단되고 있기도 하다.
영화를 붙이기가 어렵다보니 일부 제작자들은 극장측에 거액의 「뒷돈」을 주면서 영화를 붙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또 배급라인이나 극장측의 횡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신씨네가 「101번째 프로포즈」를 종영할수 밖에 없었던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신씨네는 당초 중앙극장측과 관객이 하루 2천명이하로 떨어지지 않는한 종영하지 않는다고 계약했었다.그러나 중앙극장측은 관객이 2천명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음에 붙일 외화「쥬라기공원」이 흥행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자 서둘러 「101번째…」의 종영을 결정,영화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영화판에 이름이 알려져 극장측의 횡포에 대항할수 있었던 신씨네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에 속한다.아직 이름석자를 내밀만한 형편이 못되는 제작자나 감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배급업자나 극장측에 대항했다가는 다음번에 제작한 영화를 붙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방의 영세한 배급자나 극장에서 입장 관객수를 줄이는 것도 유통구조상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관객수를 속여 줄이는 것은 곧바로 제작자에게 분배 수익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영화제작자나 감독들은 영화유통구조의 개선을 우리 영화계 최대과제로 손꼽는다.유통문제와 함께 3대과제로 꼽혀온 기획능력부족과 소자본 제작문제는 젊은 기획자와 대기업의 참여로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유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당국등이 나서 자본력을 갖춘 배급망을 조속히 구성,영화제작자들이 유통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산영화가 활로를 찾을수 있다는 것이 영화관계자 대다수의 지적이다.<황진선기자>
1993-07-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