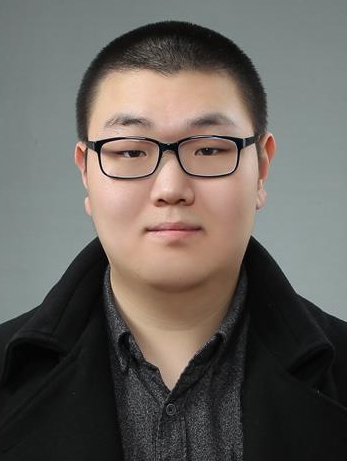

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이번 선거는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을 가르는 미국의 분열상이 트럼프 4년에 걸쳐 더욱 심해졌음을 확인해 줬다. 문제는 이 두 집단이 생각하는 ‘정상성’이 아주 다르다는 것에 있다. 바이든을 지지한 이들은 미국이 다자주의 질서, 성평등, 인종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겼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성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 전자에게는 버락 오바마 8년이 정상이고, 트럼프 4년은 비정상이다.
반면 후자에게는 오바마 8년이야말로 비정상이고, 트럼프 4년은 정상으로의 회귀였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든 4년 동안 민주당은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온 힘을 다할 것이고, 공화당은 이를 비정상을 향한 돌격으로 해석하며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40년에 걸쳐 계속해서 심해진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양당 타협 전통의 퇴조라는 추세가 뒤집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입장에서 더 곤란한 것은 정상성을 둘러싼 해석이 민주당 내에서도 갈린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주류는 빌 클린턴 이래로 세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비롯해 최근 크게 약진한 민주당 좌파는 세계화와 거대 기술기업에 회의를 품으며 성평등과 인종평등 정책에 더욱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좌파는 트럼프 이전도 딱히 ‘정상’은 아니었으며 그렇기에 새로운 정상을 만들기 위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민주당 주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화당은 이미 이런 당내 갈등의 선례를 보여 주기도 했다. 오바마 시절 약진한 강경파인 티파티와 그보다 더 강경파인 대안우파는 공화당 주류로 대거 진입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민주당 좌파가 인구 비중이 늘어난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바이든을 위시한 민주당 주류는 미국의 분열과 당내의 동상이몽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그 과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정상성으로의 회귀’를 넘어서 새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스스로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든을 앞둔 정치인에게 이런 고통 감내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2020-11-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