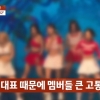대통령 사저를 가다
노무현의 이웃 같은 퇴임 대통령 ‘부메랑’비극 지켜본 文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퇴임 이후, 세상과 거리 둘 것” 줄곧 강조
기존 매곡동엔 경호동 들어서기 어려워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부지 최종 낙점

양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양산 연합뉴스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일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이 최근 퇴임 후 머무를 사저 부지(2630.5㎡·795.6평)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그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사저의 입지나 운영 방식은 퇴임 후 대통령이 현실 정치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인이 ‘거리두기’를 희망하더라도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야인’이 된 대통령을 소환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본래 살림집이 아닌 곳을 공들여 가꿨기에 풀 한 포기, 벽돌 한 장에도 애착이 남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집권 3년차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올 초부터 사저와 ‘패키지’로 묶인 경호 부지 물색에 나서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매곡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탓에 경호동이 들어서기 어렵고 마을 입구에서 외길을 따라 2㎞ 넘게 더 들어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평산마을은 행정구역상 경남이지만 울산과 인접했다. 사저가 들어설 부지와 경부고속도로는 2㎞가량, KTX 울산역과는 10여㎞ 떨어져 있어 매곡동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까지 차로 50여분 거리, 어머니 묘소와도 비교적 가깝다.
양산의 교통 요지에 들어선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열린 사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일대가 통도사 땅이고, 평산마을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시골길이 이어진 데다 언덕 지형인 탓에 개방형 건물을 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3주년 회견 때 퇴임 이후를 너무 상세하게 언급해 놀라기도 했지만, 대부분 초지일관 해왔던 말씀”이라며 “재임 기간 방전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퇴임 이후 현실 정치와 연을 끊고 잊혀진 사람으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 사저’를 지향했던 노 전 대통령과는 애초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신문DB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대통령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민으로서, 은퇴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꼭 성공하고 싶었다”고 회고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의식과 진보적 담론의 토론 공간으로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했고, 봉하를 생태마을로 꾸미는 한편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 국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웃 같은 퇴임 대통령의 모습을 사랑했고,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1만여명이 봉하를 찾았다. 결과론이지만 ‘부메랑’이 됐다. 문 대통령은 ‘운명’에서 “봉하에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현상, 퇴임 이후 오히려 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는 일들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됐다. 이후 시작될 불행한 사태의 전조였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엔딩 후에도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순례’하듯 봉하를 찾고 있으며, 친노·친문 인사들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주요 변곡점마다 들러 참배하고 권 여사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못지않은 강력한 ‘정치적 팬덤’을 지닌 데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뒤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 따른 국격 제고 등 ‘레거시’(업적)를 쌓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 뜻대로 잊혀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실 정치와 연을 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친문 인사는 “대통령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며 “퇴임 이후 문재인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하면 이런저런 요구들이 많겠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단호해 기념관 건립 등 기본적 사업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6-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