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베르토 에코의 7번째이자 마지막 소설…저널리즘 정보의 한계·위선 통렬히 비판
제0호/움베르토 에코 지음/이세욱 옮김/열린책들/336쪽/1만 3800원

움베르토 에코
이탈리아의 유명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1932~2016)가 소설 ‘제0호’에 대해 한 말이다. 그의 일곱번째 소설이자 마지막 소설인 ‘제0호’는 극단적으로 썩어빠진 언론사를 다뤘다.

서울신문 DB

1945년 4월 29일 이탈리아 밀라노 광장에 매달린 베니토 무솔리니(왼쪽)와 애인 클라라 페타치(오른쪽)의 주검. 페타치와 심복을 데리고 스위스로 달아나던 무솔리니는 공산 게릴라들에게 붙잡혀 총살당했다. 소설 ‘제0호’는 무솔리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쳤다는 가설로부터 시작된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그런데 이 신문사, 좀 독특한 구석이 있다.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신문을 만드는 것이 이 신문사의 비밀 강령이다. “우리 콤멘다토레는 금융계와 은행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성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아마 큰 신문을 이끄는 엘리트의 세계에도 들어가고자 할 겁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기가 새 신문을 창간하려고 한다면서, 장차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36쪽) 도마니의 뒷배인 ‘콤멘다토레’는 지방 TV 채널과 잡지 몇 개를 운영하는 야심만만한 기업가다. 콤멘다토레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되는, 끝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창간 예비판이 이들의 ‘제0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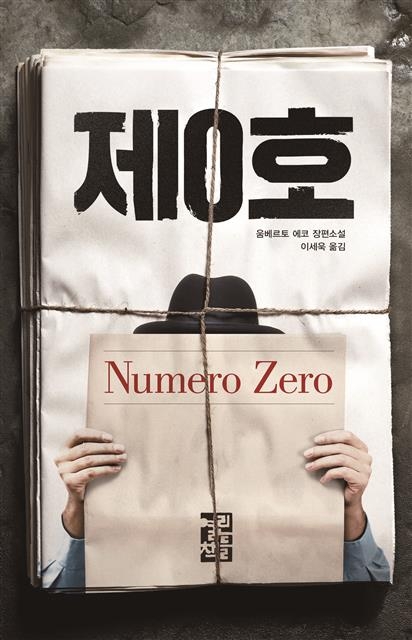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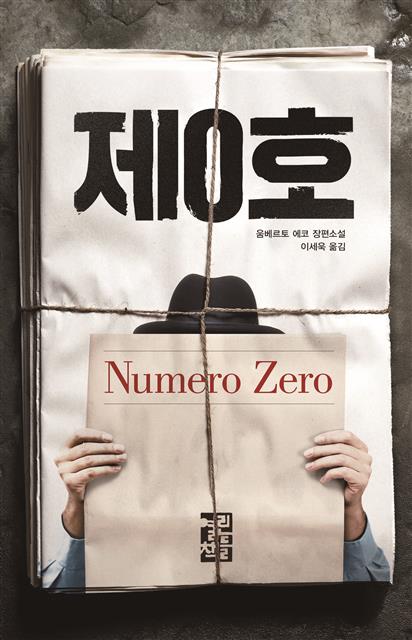
자신이 저널리스트였던 에코는 극단적 상상에 기반한 가상의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더없이 사실적인 양태를 그렸다. 소설 속 주필 시메이와 기자들의 문답들이 그렇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사를 쓸 때마다 콤멘다토레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른바 지배 주주이거든요.”(113쪽)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주장을 싣되, 진부한 의견을 먼저 소개하고 기자의 생각을 나중에 배치해 독자가 심정적으로 기자의 의견에 기울게 만드는 ‘스킬’ 등은 기사를 쓰고 읽는 일이 얼마나 주관적인 일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제0호는 ‘에코 소설은 어렵다’는 편견을 넘어선다.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실존 인물과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이 등장해 심리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진다. 문장도 쉽고 각주 읽을 일도 비교적 적다. ‘장미의 이름’을 읽으려다 수차례 실패한 경험에 비춰봐도 에코 소설 중엔 제일 만만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가 매일같이 하는 일을 수상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188쪽) 시메이의 일갈에서 언뜻 영화 ‘베테랑’ 속 유아인의 대사가 스쳐 지나간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했던가. 언론계 대선배 에코가 마지막으로 남긴, 표적을 향해 무분별하게 문제를 삼는 언론과 이러한 ‘스킬’이 먹히는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8-10-26 37면



























![미국 맛 가미한 보물 찾기…한국 맛과 다른 백수 아빠[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