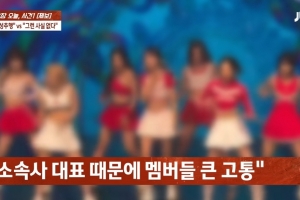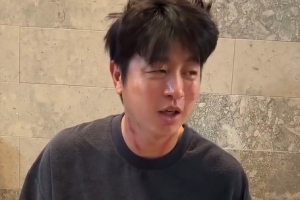영화 ‘더 스퀘어’를 만들기 전,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은 같은 제목의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복잡한 작품은 아니다. 벽돌로 정사각형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런 문구를 써놓았을 뿐이다. “전시 ‘더 스퀘어’는 신뢰와 배려의 공간이다. 이 안에선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게 대체 뭘까 싶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현실과 차별화된 이상적 공간을 부각해,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적대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믿음 속에 상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영화 ‘더 스퀘어’도 그 연장선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작품의 미덕은 메시지에 담긴 내용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관건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만약 ‘더 스퀘어’가 관객의 깨우침을 강요하는 상투적인 방식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 영화가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는 일도 없었을 테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메시지 내용이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계속 시험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데 있다. 크리스티안(클라에스 방)이 바로 그 시험에 든 남자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인 그는 현재 ‘더 스퀘어’ 전시 개최를 준비 중이다.
크리스티안은 ‘더 스퀘어’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해설하는 지적 능력이 있다. 한데 그가 ‘더 스퀘어’의 메시지를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실천 능력까지 갖췄을까. 이와 같은 물음 아래 이제 그는 첫 번째 과제에 직면한다. 아침 출근을 하는 크리스티안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어떤 사내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크리스티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궁금해진다. 혹시 곤란해질지도 모르니 여자를 모른 척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 여자를 도와줄까. 본인의 온전한 결단인지는 모호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후자를 따른다.
다행히 사건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크리스티안은 더 어려운 과제들과 마주한다. 이를테면 그가 여자를 구해 주었으나 그 와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그렇다. 알고 보니 소매치기꾼들에게 당한 것이다. 크리스티안은 선의의 행동이 자기가 호구였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음을 확인했다. 이럴 때 그는 또다시 ‘더 스퀘어’의 메시지를 따를 수 있을까. 답은 이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는 “나는 인간을 믿는다 / 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하는 갈림길이 있다. 거기에는 각각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수가 표시된다. 크리스티안(그리고 그의 두 딸)은 어떤가 하면 숫자가 더 많은 쪽으로 발걸음을 뗐다. 이로써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더 스퀘어’는 윤리가 이미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윤리를 새로 생성해 가는 공간이라는 사실 말이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