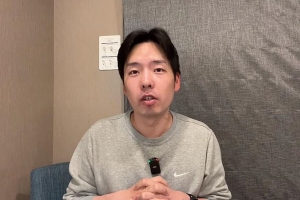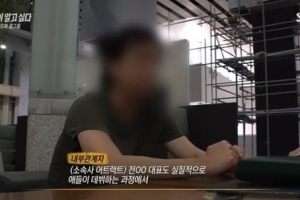‘파리 투 마르세유:2주간의 여행’이라는 제목대로, 이 영화는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가는 2주 동안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여행지와 여행 기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여행을 같이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목적이다.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파트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아저씨 세르주(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아랍계 청년 래퍼 파훅(사덱)이다. 이 조합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세르주는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고, 랩은 들어 본 적도, 들어 볼 마음도 없는 프랑스 기성세대의 전형이다. 그런 그와 2주나 동행해야 하다니, 파훅의 마음도 암담했으리라.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함께 여행을 하게 됐나. 파훅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다. 그는 파리에서 불량한 래퍼 무리와 승강이를 벌이다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 프로듀서 빌랄(니콜라스 마레투)은 파훅에게 몸을 숨기라며, 곧 여행을 떠날 예정인 자기 아버지 세르주에게 전후 설명 없이 그를 보낸다. 세르주의 입장에서 보면 파훅은 빌랄을 대신해 운전수 역할을 해 줄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에 서로에게 호의를 가질 이유가 없는 까닭에 둘은 계속 티격태격한다. 이제 세르주의 여행 목적을 말할 차례다. 한마디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18세기 화가 베르네의 자취를 밟으면서 당시 그가 그렸던 회화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르주와 파훅에게는 접점이 하나 생긴다. 두 사람이 미술과 음악―예술을 한다는 점이다.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만 상대방을 대하던 세르주와 파훅은 각자의 예술을 매개로 조금씩 불통의 간극을 좁혀 간다. 아예 소통이 되지 않던 두 사람이 소통을 시도한다는 변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감독 라시드 드자이다니는 현재 프랑스가 안고 있는 세대 갈등 및 인종차별 문제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관점으로 풀어낸다. 세르주의 막말을 견디다 못해 자리를 떠난 파훅이 처량하게 서 있는 그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돌아와 말없이 안아 준다든가, 파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세르주가 발 벗고 나서는 장면을 보면 사람이 가진 온기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
영문학자 애덤 브래들리는 랩이 곧 시라는 주장을 담은 책 ‘힙합의 시학’에 다음과 같이 썼다. “언어가 빚어내는 낮은 리듬은 베이스의 울림을 불러낸다. 한편 마음을 가로지르는 가사 구절은 고막을 통해 진동한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음악과 가사는 그대로 있었다. 받아들이는 당신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힙합의 시학’이다.” 음악과 가사는 그대로인데, 받아들이는 당신이 바뀌었다는 구절이 의미심장하다. 우리를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파훅의) 랩만은 아닐 것이다. 이 영화는 또 다른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7일 개봉. 12세 관람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