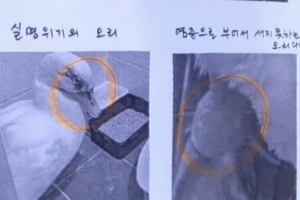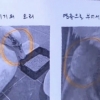황인숙 시인
그래도 오늘 낮부터 비가 올 거라는 라디오 예보를 들으니 가슴께가 서걱서걱 살얼음 지는 걸 어쩔 수 없네. 이맘때의 비는 젖은 눈처럼 추적추적 내린다. 어차피 올 비라면 꾸물꾸물하지 말고 얼른 시작해서 늦어도 오후 4시에는 그치렷다! 언제부터인가 비 오는 게 싫다. 그토록 좋아했는데 꺼리게 된 세 가지, 눈과 비와 긴 계단. 하,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상큼한 목소리로 전하네. 많은 비가 예상되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리라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하트에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기꺼워하는 팝송을 들려준다. 그 빗방울은 한여름의 빗방울, 청춘의 빗방울이지. 나도 비가 오면 가슴이 설렜었다. 어떤 날은 티셔츠와 짧은 바지, 어떤 날은 한 겹 미니 원피스, 최소한의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보슬비건 폭우건 하염없이 빗속을 걸었던 여름날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갈 때면 샌들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었지. 아스팔트 위를 개울로 만든 빗물이 콸콸 흘러가며 발가락 새에서 간질거렸지. 하하, 비 맞고 다니면 머리카락 빠진다는 걱정 어린 충고에 나는 머리카락 빠지면 더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머리숱이 무거울 정도로 많았단 말이지. 쳇,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좋은 건 다 과거형이로군. 그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건만. 젊은 날에도 빈약했던 내 좋은 것들이여, 빈약했기에 이제 와서 이리 생생한 건가. 그러니 무엇이든 다 괜찮은 구석이 있네.
며칠 전 M C 비턴의 추리소설 ‘매춘부의 죽음’을 읽다가 거기 인용된 T H 베일리의 글귀에 한참 울가망했었다. ‘나는 나비가 되고 싶어. 방랑자처럼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면 죽어 가면서.’ 그 허망함, 그 연약함, 그 오만함, 그 초연함. 유치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던 뭘 모르던 시절, 정확히 말하면 그 시절의 나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에 가슴이 아렸다. 베일리는 알았을까? 그건 요절에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려면 나비처럼 딱 한 시절만을 살아야 한다. 늙지 않으려면 죽어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늙어야 하는데, 늙는다는 건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도 꾸역꾸역 사는 것이다. 아, 모든 건 다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살아 내서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면 죽어 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히 느끼고, 그러지 못해 통절한 상실감을 너희는 결코 모를 거라고, 요절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를 상쇄할 수도 있구나.
내 삶이 나비 같기를(그 짧음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바랐던 시절, 방랑(그것이 정작 어떤 것인 줄도 모르면서)을 꿈꾸고 아름다움만이 지선이라고 여겼던 시절을 생각하니 나비 같은 소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장면이 떠오른다. 점심시간이었다. 학교 안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교실 문 앞 복도에서 귀에 익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기에 맞춰 급우 예닐곱 명이 춤을 추고 있었다. 한 옆 녹음기의 릴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보케리니의 미뉴에트가 끝나자 한 애가 무리에서 나와 쪼그려 앉아서 테이프를 되돌렸다. 아마 그 애는 제 언니에게 배웠을 포크댄스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을 테다. 다시 아이들은 즐거운 얼굴로 그 애의 리드를 받으며 춤을 추고, 나는 둘러서서 구경하는 무리에 끼어 있었다. 춤추는 무리에 친한 애도 서넛 있건만 나는 그저 부러워할 뿐 바라만 보고 있었다. 지금 같았으면 “거참 재밌겠다!” 하면서 끼어들었으련만. 무용 수업 시간에조차 전부 춤출 때는 몰라도 한 줄씩, 혹은 혼자 춤을 춰야 할 때면 꼼짝도 안 해 선생님께 야단을 맞곤 했으니, 나는 수줍기도 수줍고 시선 공포증이 있었던 거다. 나이 들면서 낯이 두꺼워지니 남의 시선의 가림막이 생긴 듯 다소 편하다. 아, 눈이 오네….
2017-02-2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