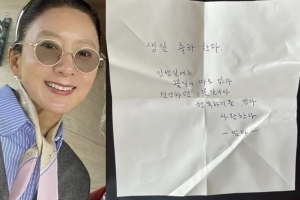리가 몇 년 만에 맨체스터 바이 더 씨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형은 아들 패트릭(루커스 헤지스)의 후견인으로 그를 지정하고 세상을 떠났다. 리는 당황스럽다. 조가 살아 있을 때 그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들은 바가 없었다. 갑자기 고등학생 조카의 양육을 떠맡게 된 리. 그는 패트릭을 데리고 보스턴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이곳에 있는 조카는 삼촌의 생각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영화는 이런 대치-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장소에서 떠나려는 사람과 남으려는 사람의 갈등을 다룬다.
조의 죽음에 패트릭의 잘못은 없다. 애도 과정을 충실히 거치면서 그는 이곳에 계속 살아도 될 것이다. 반면 리에게 이곳은 자꾸 예전의 추억과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날은 그의 현실로 느닷없이 밀어닥친다(실제로 감독이 특히 신경쓴 부분이 과거가 현재로 소환되는 장면의 교차편집이다). 리는 고향을 견디지 못한다. 무엇보다 그의 실수로 아이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동네 사람들은 리의 불행을 이해하는 척하며 뒤에서 수군댄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었다는 사실은 같다. 그렇지만 이처럼 죄책감의 여부에 따라 삼촌과 조카의 이후 선택은 달라진다. 다시 그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각자의 장소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5일 개봉. 15세 관람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