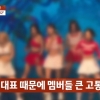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사실 서울시향의 조직 구조는 이상할 게 없다. 대표이사(사장) 아래 예술감독(상임지휘자)이 있어 지휘 계통이 분명하다. 굳이 역할과 권한의 차이를 따지자면 인사 등 경영 전반의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나, 소속 단원들의 오디션과 레퍼토리 선정 등 예술적 측면의 권한은 예술감독에게 주어진다는 정도다. 아무튼 최고경영자는 사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밖에 비춰지는 위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표와 예술감독이 분리된 조직에서는 명망가인 예술감독의 힘에 압도돼 대표의 존재가 미미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바지사장’을 면치 못한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이 강조되는 기관에서 더욱 그런데, 아시아 최고를 꿈꾸는 서울시향이 적절한 예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경영을 앞세워 부여된 권한을 전폭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면 갈등은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최고경영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고매한 예술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나온 예술경영이 주목받으면서 예술기관 최고경영자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정치 환경 변화기에 ‘낙하산’이니 뭐니 해서 말도 많지만, 예술기관장에 주목하는 것은 수많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을 방만하지 말고 알차게 경영해 달라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아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여태껏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 최고경영자의 배출 통로는 대충 다섯 갈래 정도 된다. 첫째는 고위 관료 출신들이다. 최근 ‘관피아’ 배척 분위기 탓에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동안 큰 몫을 차지했다. 둘째는 예술가 출신들이다. 요즘 부쩍 진입이 활발한 편이다. 셋째는 현장에서 성장한 예술경영 전문가들이다. 넷째는 언론과 학계 출신들이고, 마지막은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들이다. 그룹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근자에는 기업인 출신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예의 예술경영이 강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굴지의 기업 출신 최고경영자들이 예술기관에 속속 입성했다. 그러나 다른 그룹에 비해 이래저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중도 하차했다. 서울시향도 그랬다. 치열한 산업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들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왜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내는 걸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나, 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리더십 차이에 대한 몰이해를 으뜸으로 꼽는다. 기업은 성과와 보상이 명확한 ‘거래적 리더십’이 빛을 보는 곳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두다 보니 성과 측정도 보상책도 약하다. 대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와 정부 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차별적 요구를 조정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다. 작금의 서울시향 내홍(內訌)은 이와 같은 리더십의 상충 과정에서 드러난 민낯인 셈이다.
2015-09-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