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그림 뒷 얘기 알고 보면 큰 재미”
몇 해 전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 그림에 대한 열기. 간송미술관의 ‘풍속인물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의 ‘초상화의 비밀’, 삼성미술관 리움의 ‘조선화원대전’이 빅히트를 친 지난해 기억이 새삼스럽다. 간송미술관의 ‘풍속인물화대전’은 불과 2주일간의 짧은 전시에 6만명이 다녀갔다. 전시 최종일에는 2㎞의 장사진을 쳐 간송미술관 문턱을 밟기까지 7시간 걸린 초유의 기록도 세웠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비롯해 소설이나 영화화된 우리 그림과 접해 보자는 기운이 일었어요. 우리 전통에 대한 호기심과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영향으로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결합하면서 애호가, 연구자 등에 한정됐던 우리 그림을 향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로 번진 것으로 봅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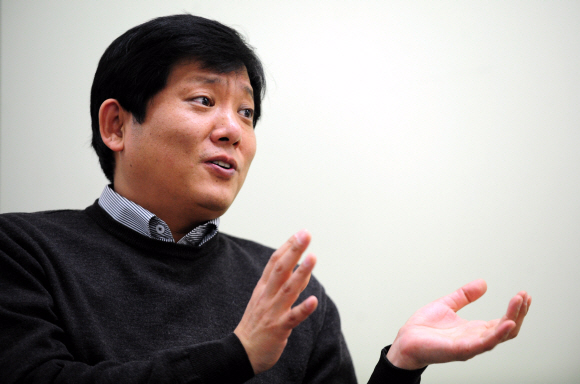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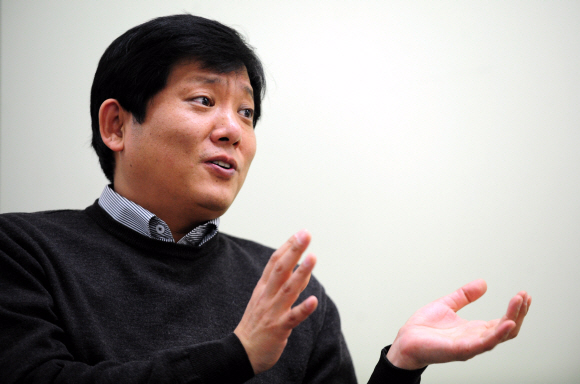
백인산 간송미술관 상임연구위원은 우리 그림의 이모저모를 알고 들여다보면 더욱 친근감을 갖고 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간송미술관의 백인산(45) 상임연구위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나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대학(서강대 사학과,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과 21년간 간송미술관 연구원으로 지내며, 우리 그림 수천점을 보고 연구해 온 백 위원이 눈높이를 확 낮춘 우리 그림 입문서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화훼영모·사군자화’를 펴냈다. 초보자라도 단숨에 읽어내릴 수 있는 쉬운 서술이 큰 장점이다.
→우리 전통 그림에 낯선 사람이 아직 많은데.
-친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릴 적부터 서양 미술에 비해 덜 접했기 때문이다. 음악을 들어보지 않으면 어렵듯, 처음의 낯섦을 없애야 한다. 많이 접하다 보면 친해지고, 더 알고 싶어진다. 그림은 읽어야 한다지만 감각적으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화훼영모(花卉翎毛·동식물 그림)나 사군자화가 지닌 매력은.
-세월은 흘렀어도 나무와 꽃, 새와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대중과 공유하고 느꼈던 감흥을 지금도 쉬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산수나 인물화보다는 장수나 무병, 입신을 기리는 길상의 의미에 장식성까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도 그것을 아끼고 즐기며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다. 다만 즐기며 사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뜻은.
-우리는 지금 사물을 대할 때 사군자나 화조(花鳥) 다 마찬가지로 여기지만 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예컨대 대나무를 보면 옛 사람들은 지조, 절개, 충절을 떠올렸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러는가.
→화훼영모가 사군자화보다 한급 아래라는 인식이 있는데.
-조선시대 화원(畵員) 선발시험을 보면 분명 등급이 있었다. 대나무가 1등, 산수가 2등, 날짐승과 길짐승을 그린 영모가 3등, 화훼와 초충(草蟲) 이 4등으로 배점됐다. 왕실이나 사대부의 심미취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그 순서대로 그림을 좋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대에 화훼가 낮고 대나무가 높고 하는 기준,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군자(四君子)란 말의 역사가 짧다고 하던데.
-매란국죽(梅菊竹)을 사군자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의 어느 옛 문헌에도 사군자란 표현은 없다. 사군자라고 묶어 칭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사군자는 중국에서 온 표현이긴 하지만 중국에서조차 17세기부터 나왔다. 과거에는 세한삼우(歲寒三友·추운 겨울의 세 벗)나 삼청(三淸)이라고 해서 송죽매(松竹梅)를 일컬었다. 삼청에 들었던 소나무이지만 문인들이 그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군자에선 빠지게 된다. 이런저런 연원을 알고 우리 그림을 보면 한층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
2012-02-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